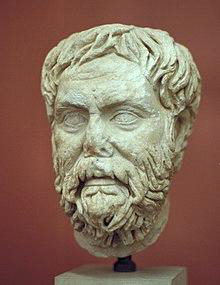[과철이] Lec 15 - 문화상대주의의 논리적 문제점, 인식에 대한 상대주의 논박
Precaution
서울대학교 김영 교수님의
과학의 철학적 이해23-2 의 Lecture note 입니다.
문화상대주의의 논리적 문제점
문화상대주의가 제시하는 논증 :
전제 : 서로 다른 문화들은 서로 다른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다
결론 : 도덕에는 어떤 객관적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들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 규범’이라는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축하지 않음. (전제와 결론의 연관성이 없다.)
문화에 따라 (올바르다고 믿는 바 / 올바른 것)은 달라질 수 있다. : 올바르다고 믿는 바는 달라질 수 있으나, 올바른 것이 달라질 수는 없음.
서로의 문화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올바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음.
차이는 공통성(보편성, 나아가 객관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제 3의 것이 존재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차이를 인식할 수 있음. 즉 차이는 공통성을 전제한다.
서로 다른 2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제 3의 기준, 개념, 전제)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 상대주의의 자기반박적 성격 : A문화는 B문화 만큼 좋은 것 → 문화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준 없이 비교할 수 없음. 즉 허무주의(nihilism, 가치, 의미가 애당초 없다고 주장하는 입론) 만이 객관적 가치의 부재에서 도출되는 유일하게 타당한 결론이다.
개념상대주의에 대한 반박 : 모든 것이 다르다면,(공통적인 것이 아예 없다면), 그 다르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은 두 문화체계가 비교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이는 자기반박적이다.
상대주의의 자기반박적 (논리적 반박)
상대주의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자기반박적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참인 주장인지 / 절대적으로 참인 주장인지) 어느 쪽을 택하여도 자기반박적 결과가 나옴.
- 이 주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참인 주장이라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주장 또한 맥락과 상황에 따라 참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부정을 막을 수 없게 됨
- 이 주장 자체가 절대적으로 참인 주장이라면, “모든”이라는 말에 해당 주장이 반례가 되어 버림.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규칙 자체가 절대적이라면 자기부정을 하는 것
-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해당 주장만을 예외처리한다면?
이 규칙(예외없는 규칙은 없다는 주장) 에는 예외가 있을까?
여기서 갈라지는 두 경우 모두 자기반박적인 귀결이 나온다.
“자기 지시의 역설” : 주장하는 말 안에 그 주장이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버리면, 역설이 발생
역사적 회의주의의 문제점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어느 시대이든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차후에는 진리가 아닌 것(오류)로 밝혀져 왔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결국엔 오류로 판명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진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상대적(일시적, 맥락적) 진리 뿐이다.
역사적 회의주의의 논변의 재구성 : 역사적으로 불변의 진리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도 결국 거짓임이 드러날 것이다.
역사적 회의주의는 사례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논증에 기반하므로, 기본적으로 귀납법의 타당성을 전제하고 있다.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 귀납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므로 귀납법이 타당하다는 신뢰성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귀납법의 타당성을 증명했다면, 귀납법으로 도출되는 무수히 많은 참인 명제들로 인해 역사적 회의주의의 반례들이 생기게 된다.
인식론적 회의주의와 귀납법 : 고대그리스의 회의론자 피론.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참인 주장은 이것 하나 뿐이다: “모든 견해는 상대적이다”
피론의 주장은 귀납적 추론(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만나며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결론)에 의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피론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참인 논증으로 인정한다면 귀납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다른 주장들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인식에 대한 상대주의의 논박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
일반적으로 모든 인식은 인식 주체의 관점(point of view)에 따라 상대적이다.
인식에 대한 상대주의의 기본적 주장에 의해 어떤 관점에 의한 주장이 올바른(객관적인) 인식인지 말할 수 없다.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상대주의를 피할 수 없을까? (관점의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인식의 상대성으로 귀착되어야만 할까?)
관점의 다양성은 일반적인 통념(상대주의로의 귀결)과 달리 오히려 객관적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 인식의 가능 근거가 됨.
즉 관점의 다양성이 열어주는 객관적 인식 가능성은 상대주의에 대한 실제적, 실질적 반박.
인간 인식의 일반적 구조
우리는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인식이 있고, 각자 얻은 인식은 모두 다르다. 이러한 서로의 전망을 공유하는 과정(의사소통)을 통해 실제로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자신의 관점과는 다른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며 인식을 개선해나갈 수 있게 된다.
관점이 다양하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인식은 동등하다”,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인지 말할 수 없다”라는 상대주의적 결론들은 나올 수 없다.
-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들의 우화 : 인간은 의사소통의 존재인데 의사소통의 부재이므로, 말이 되지 않는 우화이다.
인간은 다양한 관점에서 비롯된 다양한 인식을 서로 의사소통하므로, 모두가 하나의 상, 인식에 도달할 수도 있고, 그 인식의 객관성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
외계인에게 개미 한마리를 보낸다고 해서 개미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처럼, 인간도 사회적 네트워크 속의 존재, 그 네트워크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다.
상대주의적 인간관 : 상대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본질(의사소통)을 무시하고 고립된 개인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
인간은 자신이 본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증진된 객관적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
정보교환(의사소통)은 단순한 교환이 아님. 사물의 교환과는 다르게 인간의 의사소통 후에는 양방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게 된다.
개인으로서의 나는 정말 미미한 기여를 하면서 세계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
사회적 역사적 의사소통 네트워크(대규모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떠한 생명체도 이룩하지 못했던 문명을 발전시킴
인식이 역사적으로 순환과 확장됨(세로)와 동시에 사회적 순환과 확장(가로)를 통해 인간 사회는 객관성이 증진되고 있으며,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됨.
이런 의미에서, 관점의 다양성은 상대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성의 증진으로 이어짐.
집단지성이란? : 소수의 우수한 개체, 전문가의 능력보다 다양성과 독립성을 가진 집단의 통합된 지성이 올바른 결론에 가까움.
결론 : 나의 견해 아니면 당신의 견해 가 아니라, 나의 견해 그리고 당신의 견해.